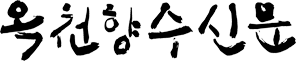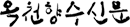■ 탄압 맞서 한북·서우학회 신간회 주축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국권회복과 학교설립운동을 위해서 각 지역 선각자들의 동참으로 전국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1907년 한일신협약인 정미7조약의 불평등 조약과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 보안법의 공포 등으로 조선 총감부의 탄압 기구와 탄압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서기 위해 역량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 4월에 대한제국의 국권회복과 공화정 근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선생 등이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의 창립과 한북학회와 서우학회의 주도 인물들이 신간회에 참여하여 주축으로 이뤘고 이를 기반으로 1908년 1월 서우학회와 통합하여 서북학회(西北學會)로 발전하게 된다.
■ 한북흥학회 발기부터 활동 두드러져
한북흥학회와 서우학회, 서북학회의 창립 과정과 취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해 이송희 교수는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의 ‘한말 한북흥학회의 조직과 활동’에서 “오상규 선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상규 선생은 이용익 대신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활동은 한북흥학회 발기에서부터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상규 선생은 서북학생친목회, 국책보상 함경도지역운동, 서북학회운동 등을 주도하였으며, 중앙학회 평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유진호는 국민교육회 운동에 참여했으며 선천 군수 등을 역임했고 특히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그 당시 “국민교육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이준 열사는 독립협회 이후 보안회, 국민교육회, 상동청년회 등에서 같이 활동한 함경도 단천 출신인 이동휘와 이용익의 손자 이종호 그리고 이용익 대신과 관계가 깊던 오상규, 유진호 등과 뜻을 같이하여, 함경도 경약소를 사무소로 정하고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를 발기했다. 한북흥학회는 계몽 강연, 토론 활동을 통해 일반 민중을 계몽하고 민지(民志)를 개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평안도와 황해도 중심의 서우학회와 통합하여 서북학회로 개편하게 되었다.”
■ 회령 고향에 흥학비 세워 찬양
오상규 선생의 고향인 함경도 회령(會寧) 서동 마을에 괴정 오상규(吳相奎) 유허비는 이용휘 선생이 글을 짓고 훗날 아들이 세웠다. 이 유허비에는 오상규 선생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 젊은이들에게 신식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고향에 직접 창효학교(彰孝學校)를 세워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특히 측량과, 야학과를 설치하여 과학 교육을 중시하니, 졸업생들이 흥학비(興學碑)를 세워 찬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서우학회(西友學會)는 대한자강회, 기독교청년회, 국민교육회, 전·현직 무관 등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의 지식인으로 후에 상해임시정부 등에서 독립운동과 국권회복의 선구자인 박은식, 이갑, 김명준, 노백린, 정운복 유동열 선생 등이 참여하였다. 서북학회는 국권회복과 민권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1906년 10월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계몽단체를 창립하였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서 비교적 빠르게 각 시군 지역의 지회 설립되었다.
■ 애국계몽운동가 오상규 서북학회 회장
서북학회는 한북흥학회가 재경 관북 유학생을 지도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자, 서우학회와 1908년 1월에 통합함으로써 창립되었고 각 지방에 31개의 지회가 설치되었다. 그 당시 대한제국은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고 일제의 온갖 탄압과 감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해 오상규 선생께서 서북학회 회장에 취임하여 학회의 활성화와 함께 많은 자금을 후원한 대한제국의 애국계몽운동가이자, 국권회복운동가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
서북학회는 1908년 1월 2일에 서울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공원 부근에 3층에 연건평 395평의 근대식 양옥으로 서북회관을 준공하였다. 서북회관은 일찍이 청나라 기술자를 불러들여 건축하였고 당시로는 보기 드문 서양식 근대식 건축물이어서 장안에 화제가 되었고 33인의 서북학회 지도자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 서북회관은 고려대학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와 서북협성학교 교사로 사용되었고 ‘종로 낙원동 교사’로 불리며 유서 깊은 신흥 사학 교사로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